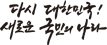내가 그 산을 처음 만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담임선생님께서 모둠 활동을 하고 매달 제일 잘한 두 모둠을 뽑으셨다. 그리고 그 두 모둠은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 모둠은 경기도 가평의 축령산을 갔다. 선생님은 환경교육단체인 ‘자연환경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셨다. 자연환경학교는 축령산에 있었다. 나중에 자연환경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축령산에 여러 번 갔다.
처음 축령산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때까지 산을 가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기껏 해봐야 우리 동네의 작은 와우산이 전부였다. 더군다나 자연에 더 가까운 산은 처음이었다. 자연환경학교 건물 앞에는 잣나무숲이 있었다. 잣나무숲 속에 들어가자 키가 큰 나무들의 그림자가 나를 가렸다.
하지만 어둡지는 않았다. 하늘을 보니 나무들이 높이 더 높이 몸을 뻗고 있었다. 녹색 잎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나무들은 친구들에 비해 키가 작은 나를 압도했다. 휘어지지도 않고 쭉 뻗었다. 그 높은 나무들 사이를 걷는데 푹신푹신했다. 짙은 갈색의 잎들이 쌓여 넓은 쿠션을 이루고 있었다. 한 잎 한 잎은 따끔거리는데 모이니까 부드러웠다. 가끔씩 그 쿠션 위에 앉곤 했는데 약간의 축축함이 느껴지곤 했다. 하지만 비 오는 날 푹 젖은 옷처럼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이 산의 냄새는 푸근하고 좋았다. 매연에 찌든 냄새가 아니었다. 한번은 잎에 맺힌 이슬을 맛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옅지만 박하 같기도 하고 쑥 같기도 한 향이 났다. 그런 산은 처음이었다. 보통 등산하면 기대하고 가도 쓰레기와 시끌벅적한 등산객의 소리에 질려서 실망하는데 이 산은 그렇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산의 소리만 들려왔다.
특히 아침의 소리는 더 좋았다. 너무 많이 들어서 질려버린 참새 소리와는 다른 새소리가 들리곤 했다. 산은 조용했다. 때문에 작은 소리도 잘 들렸다. 계곡에서 멀리 떨어졌는데도 물소리가 들렸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계곡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계곡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물장난하기에는 충분했다. 큰 웅덩이처럼 물이 고인 곳도 있고 얕게 흐르는 곳도 있었다. 나는 그 계곡을 탐사한다면서 발원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다. 처음 그 산을 만난 날 빽빽한 나무를 헤쳐 가며 바위 틈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다. 계곡에는 햇빛이 살짝살짝 비쳤다. 그 햇빛을 보면 약간 나른하기도 했다. 숲과 계곡의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다.
하루는 내 나무 찾기라는 활동을 했다. 안대로 눈을 가리고 짝이 정해준 나무를 만져본 뒤에 안대를 벗고 그 나무를 찾는 것이었다. 눈을 가리고 짝에 이끌려 빙빙 돌아가는데 약간은 두려웠다. 하지만 푹신푹신해서 넘어져도 아플 것 같지 않았다. 나무 하나를 껴안았을 때의 까슬까슬한 느낌이 팔과 손에 느껴졌다. 불룩 튀어나온 곳도 있었다. 안대를 벗고 아무 나무나 껴안았다. 신기하게도 나무마다 다 느낌이 달랐다. 모든 나무가 거칠고 갈색으로 같아 보였는데 말이다. 틀리지 않고 내 나무를 찾을 수 있었다.
나무도 사람처럼 생김새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걸 알았다.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니까 또 느낌이 달랐다. 나무를 껴안아 본 것은 그게 처음이다.
축령산은 여러 번 갔던 만큼 추억도 많다. 며칠씩 자보니 아침에 다르고 낮에 다르고 밤에 다르다는 것도 알았다. 아침에 계곡에서 세수할 때면 상쾌하고 낮에 놀러가면 활기차고 밤에 가면 약간 으스스하다. 하지만 밤에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푸근하다. 우리 동네의 와우산을 보면 전부 밀어내고 아파트로 가득하다. 불쌍하기도 하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하지만 축령산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웠다. 원래 이 세상 모든 산이 자연스러웠겠지만….
그 산에 가본 지 2년 정도 되었다. 언제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한다. 그 산, 그 숲은 정적이 흐르지도 시끄럽지도, 아주 밝지도 어둡지도 않다. 향긋하지만 향수처럼 진하지도 않다. 뭐든지 적당하고 편안하다.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동그랗게 흔들리며 비칠 때는 그 산이 생각나곤 한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 산만큼 자연스러운 산도 없었기 때문에.
공부하느라 지쳐 있을 때, 서울의 공기에 숨이 막힐 때마다 나는 그 산을 떠올린다. 내 호흡을 시원하게 해주는 산의 공기와 마음을 가다듬어 주는 산의 내음이 지금도 내 곁에 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