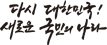먼 옛날, 마고라는 이름을 가진 거인이 살았다. 거대한 마고는 지상 위를 걷다가 한 곳에 이르러 손가락을 세워 땅에 박고는 흙을 찢었다. 그리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시간이 흐르고, 작은 나무들이 자라났다. 그것이 자라고 또 자랐을 때 숲이 이루어졌다. 마고의 숲이라 불리우는 숲이.
만약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같이 마고의 숲에 가보지 않을래?’라고 말한다면 많은 이들이 농담 쯤으로 여길 것이다. 숲이면 숲인 것이지 마고는 또 뭐야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난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마고의 숲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안네의 일기로 유명한 안네의 소중한 친구 ‘키티’처럼, 어느새 내 마음 속 깊게 자리 잡은 마고의 숲을 처음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글짓기를 배우기 위해 문화원의 어린이 문예교실에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서 장성유 동화작가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다. 같이 웃고 떠들 만큼 친해진 어느 날,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달에 한 번 숲에 가자고 하셨다. 당연히 싫다고 할 리가 없었고, 기다리던 첫 만남의 날은 금세 다가왔다.
옅은 파란색의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 피어나는 맑은 날씨였다. 간단한 간식을 가지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큰 길을 따라 걷는 기분은 소풍의 것과 흡사했다. 그리고 약 10분이라는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청계산 자락에 도착했다. 장난을 치는 바람에 땀이 송글송글한 우리들에게 입구 쪽에 위치한 약수터의 물맛은 세상 어떤 물맛과도 비교할 수 없음이었고, 가슴 깊은 곳까지 시원해졌다. 햇빛의 반사로 보석처럼 빛나는 초록연두의 나뭇잎을 보며, 선생님께서 오자고 하신 숲의 모습에 대한 들뜬 의문을 콩닥콩닥 가슴에 품었다. 그것은 나의 기억에서 처음으로 숲이 목적지였기에 더욱 그랬다.
약수터를 지나자 작은 길이 나타났다. 열기로 지글거리고 딱딱하기만 한 시멘트가 아닌, 갈빛 속에서 숨쉬는 흙의 길은 보드라웠다. 나의 발을 감싼 양말과 신발이 순간 원망스러울 만큼. 그렇게 잠시 동안 걸음을 옮기자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한 장본인을 볼 수 있었다. 둥그렇게 감싸안은 형태의 숲을 보고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은 ‘기대한 보람이 있다’ 였다.
경쾌한 녹빛 속에서 선선한 숲바람이 물결처럼 흘렀다. 잔뜩 웃음을 띄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작은 감탄사를 내뱉는 우리의 머리카락은 움직여 볼을 간지르는 것이 반갑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다. 소박하지만 예쁜 꽃, 작은 새, 곤충, 벌레, 풀, 나무… 이 모든 것을 숲이라는 어머니가 보듬어 안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중앙에 자리 잡은 커다란 나무를 가리켜 선생님의 나무라 하시고 그 주위에 우리들을 앉게 하셨다. 그리고는 나지막하면서도 특유의 어감을 지니신 채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이 곳은 마고의 숲이야. 왜 마고의 숲인지 들어 볼래? 간간한 새소리와 어우러진 이야기는 물론 믿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미 산타클로스를 부정하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결코 한순간의 농담거리는 아니었다. 마고의 숲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더 이상 평범한 숲이 아니게 된 것이다. 거인 마고가 만든 숲은 실제임과 동시에 꿈이 되었고 우리의 세계가 되었다!
그 세계에서 또한 우리는 저마다 하나씩의 나무에 손을 내밀었다. 내 나무. 그것이 명칭이었고, 내 나무에 이름을 붙여 주었다. 이름은 친숙해짐의 또 다른 매개체이니까. 나의 ‘내 나무’ 이름은 두리로 정했다. 촌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정겹고, 가장 높은 가지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데서 지은 이름이었다. 두리, 두리. 오래된 친구의 익숙한 냄새가 두리에게도 풍겼다. 나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지나친.
그 뒤로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마고의 숲을 찾아갔다. 난 친구와 마고의 숲 지도를 만들기도 했다. 경사가 심해서 위험길, 돗자리 펴기 좋은 곳이라 돗자리 쉼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마다 달라지는 숲의 색깔에 우리의 웃음 색깔도 달라졌다. 그중 가장 신선했던 것은 뭐니 뭐니해도 숲 하면 떠오르는 초록빛이었을 것이다. 중학생이 되어 시험이다 공부다 해서 추억이 되어 버린 마고의 숲. 그러나 난 복잡한 현대사회 속의 내 마음에 어머니처럼, 친구처럼 다가온 우리들의 숲, 우리들의 세계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자란 만큼 자라고, 변화된 마고의 숲과 두리에게 ‘다시 만나서 반가워.’라고 인사할 것이다.
끝으로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고의 숲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인 마고는 어떤 숲에서라도 웃으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우리의 뒤를 이을 후손들도….
“같이 마고의 숲에 가지 않을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