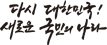상쾌한 아침, 나는 짙게 깔렸던 새벽의 정적이 따스한 햇볕에 밀려가듯 흙길을 달리며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뒷산을 찾아간다. 언제나 나에게 푸르디 푸른 산소로 비로소 숨쉴 수 있게 해주는 숲을 말이다. 그 숲은 숨 막히는 콘크리트 세상에서 여지없이 죽어가던 내게 그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주곤 한다. 그런 숲을 처음 만난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시골로 내려가시던 5년 전, 아마도 그해부터였으리라.
“할아버지, 할머니 걱정하지 말고 서울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힘들면 내려와서 놀고, 쉬?그래라. 알겠지?”
“참, 할머니, 할아버지 고집도. 적적한 시골서 아무것도 없이 이 허허벌판에서 두 분이 어떻게 사시려고….”
이렇게 숲과의 만남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남은 일생을 시골에서 보내시겠다는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처음 한동안은 시골에 가면 사람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심심했다. 그러던 중 나는 집 뒤에 있는 숲을 바라보게 되었다.
“보람아, 심심하니? 할아버지랑 뒷산에 심은 고구마 보러 갈까?”
“네? 할아버지, 뒷산에 고구마도 심으셨어요? 와,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를 따라서 뒷산에 고구마를 캐러 가며, 쪽파를 심으러 가며, 밤을 따러 가며, 누렁이와 산책을 가며 나는 빼어나게 높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특별할 것도 없는 할아버지네 평범한 뒷산과 조금씩 친해졌다.
숲은 묵묵히 나의 투정도 받아 주었고, 그 대자연의 숨결로 몸소 진리를 실천하며 대답도 해주었다. 봄이면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도 다시 돋아나는 잎으로, 여름이면 열심히 키워낸 빼곡한 나무들로, 가을이면 사람이며, 새며, 다람쥐며, 여름내 열심히 키운 열매들을 아낌없이 나누어줌으로, 겨울이면 그 혹독한 눈보라와 모진 바람을 견뎌냄으로. 나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산의 심오한 가르침에 빠져갔다. 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이해할 줄도 알았다. 법정 스님의 「설해목」을 읽으며 진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줄 알게 되었고, 이양하의 「나무」를 읽으며 그렇다고 할 줄도 알게 되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에 산을 조금씩 닮아 가고 있었으리라.
나는 그런 산이 좋았다. 화려하지 않아서 좋았으며, 불평할 줄 몰라서 좋았으며, 많이 갖지 않아서 좋았으며, 또한 나눌 줄 알아서 좋았다. 하지만 그런 산이기에 좀더 일찍 알지 못했다. 그런 산이기에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 화려하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비싸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직접 농사지으신 호박, 고추, 가지, 감자, 고구마를 아낌없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힘드셔도 힘들다는 말 한 마디 하지 않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자주 가지 못해도 외롭다는 불평 한마디 없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렇기에 진작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 하듯이…. 진작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 하듯이…. 꼭 산처럼 말이다. 나뭇가지를 꺾이게 하는 것은 그토록 매서운 비바람이 아니라 사뿐사뿐 내리는 눈이라는 진리를 알기에 산은 그렇게 엄격함과 조급함 아닌 부드러움과 여유로 내게 소중함을 가르쳤나보다. 이토록 사무치는 감사함과 소중함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다.
하지만 요즘 부쩍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은 산의 주변이 많이 변해간다. 산 앞의 넓은 논 앞에 아스팔트길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이렇게 야금야금 나의 숲을 잃을까봐 두렵다. 나의 휴식처이자 나의 선생님이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의 터전인 숲을 잃게 될 것 같아 슬프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숲이기에, 그렇기에 더욱 슬프다. 항상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만 같던 산이 사람들의 눈앞 실리에 가려져 죽을까 그것이 두렵다. 사람들에게 상처 한번 주지 않은 숲이 사람들에게서 상처만 받게 될까 그것이 두렵다. 이제야 조금이나마 산을 알게 된 내가 산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고 보내게 될까 그것이 두렵다. 그와 함께 산을 통해 이제야 감사함을 느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 계시지 못할까봐 그것이 걱정된다.
그랬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실로 나에게 산과 같았다. 아무렇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는 뒷산과 같이,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뒷산처럼 말이다. 그렇게 산은 또 다시 그 부드러움과 여유로 할머니, 할아버지께 잘 해드리라며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이리라. 나 또한 산의 가르침이기에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뒷산과 할머니, 할아버지는 닮아도 너무 닮았다. 마치 하늘이 내려준 쌍둥이와 같이. 뒷산은 존재함으로써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 뒷산은 아낌없이 나누어 줌으로써 나를 눈물짓게 만든다. 뒷산은 아무런 말없이 뒤에서 보듬어 줌으로써 나를 일어서게 만든다. 산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눈물짓게 만든다. 콘크리트로 된 눈물이 아닌, 흙으로 된 눈물을 말이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느끼듯, 산에서 그 눈물을 느낀다. 그렇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에게 숲이며, 실로 숲은 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인 것이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