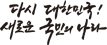꽃집의 화려하고 소중하게 길러진 듯 기품이 넘쳐흐르는 꽃들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즐거웠던 어린 날의 나는 서양화의 긴 이름 외우기를 좋아했다. 내가 알고 있던 풀밭에 피는 꽃들은 제비꽃과 민들레정도에 불과했고 초등학교 들어와서야 그 동안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국식 이름의 ‘야생화’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꽃 이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할 아름다움보다는 웃기고 촌스러운 한국말이라는 생각밖에 주지 못했다. 그것은 꽃 이름이라면 늘 혀 꼬부라진 소리로 발음하는 영어여야만이 그 꽃의 특별함을 잘 나타내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제 빛깔을 맘껏 뽐내는 도도한 서양화들에 비해 대부분 키도 작고 어디 있는지 찾기조차 힘든 볼품없는 야생화에 대해 ‘색깔 있는 풀’이라는 정도밖에 느끼지 못했 던 탓이기도 했다. 6학년 때였던가 우리가족은 여름피서로 사람이 북적대는 바다를 피해 아는 사람을 통해 어디에선가 찾아내었다는 산 속의 계곡을 향해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거리까지 올라오자 우리가족은 각자의 배낭을 어깨에 매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다. 처음에는 지루한 오솔길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니 얼마쯤 지나자 시원한 바람이 아래에서부터 불어오며 산등 성이의 내리막길이 펼쳐졌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엄마와 아빠는 일부러 계곡으로 질러가지 않고 산을 빙 둘러 간 것이라고 하셨다. 가파른 길을 올라오르다 지쳤던 나는 상쾌한 나뭇잎 내음을 품은 바람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보니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었는데도 지천으로 나지막한 꽃들이 피어있었다. 앙증맞은 노란 꽃잎이 달린 미나리아재비들과 열매처럼 봉긋이 솟은 꽈리. 털이 보송보송 오른 박주가리. 하얀 날개의 나비처럼 팔랑이던 흰물봉선화며 보랏빛의 잔대 까지 야생화들은 그렇게 길게 자란 풀 사이로 삐죽삐죽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여름은 1년중 가장 다양하고 화려한 야생화가 피는 계절이라고 했다. 편편한 바위 위에 앉아서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바라보는 야생화들은 꽃집 꽃들 만을 상대(?)해 왔던 나에게 색다른 느낌과 조용하고도 단조롭지 않은 작은 감동을 주고 있었다. 여름피서를 마치고, 물놀이의 즐거움이 끝나고 나자 나는 작고 볼품없는 꽃이라는 야생화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야생화는 결코 밋밋하고 촌스러운 ‘색깔 있는 풀’이 아니었다. 야생화는 바람과 주위의 풀과 조화를 이룰 줄 알았으며 뿌리박은 흙과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친화력을 자랑했다. 야생화들의 색에는 유치하지 않은 가운데 분명함이 있었고, 그 색들은 시각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마치 촉 촉함을 머금은 듯 피부에 닿는 느낌마저도 상상하게 했다. 또한 팔랑이는 잎사귀들이 부딪혀 내는 소리 또한 여느 음악 못지 않게 감동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에 비해 길다란 바구니에 담긴 꽃집의 꽃들은 각자의 빛깔만을 눈이 부시도록 내뿜었고 항상 꽃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밀려드는 꽃향기에 약간의 어지러움증을 느껴야만 했다. 야생화는 자신만의 향을 드러내지 않는다. 야생화의 향기는 바람과 한데 뒤섞여 살풋이 코에 머물다 가는 아주 약하고도 상쾌한 향이었다. 야생화는 파란 하늘아래서도 붉어지는 노을 아래에서도 기꺼이 다른 이의 빛과 어울릴 줄 아는 지혜를 지녔다. 그들은 서로 섞이며 피어나는 양보와 질서의 마음을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위로만 향해 솟아오르는 깍쟁이 꽃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조용한 광경이었고, 그런 야생화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나는 새삼 뭉클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욕심내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잠시 내 빛을 숨기고 다른 이들과 조화로움을 이루는 진정한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란 개인기만이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닐 게다. 내 빛을 오롯이 내놓으면서도 지나치게 나의 색을 강조하지 않는 조화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싶다. 또한 작고 연약한 야생화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던 생명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것은 서로 다투고 피어오르는 과정에서 생긴 전투력이 아니라 각각의 생명을 존중하며 함께 피어나는 야생화들만이 가진 지혜였다. 조금만 지나도 죽어버리는 커다랗고 화려한 꽃집 꽃들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인함. 불어오는 강풍에는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들의 끈기! 인간은 너무나 쉽게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유난히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는 다시금 야생화의 강한 생명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타는 가뭄 속에서도 심한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는 야생화의 끈질김처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말이다. 나는 문득 바쁘고 여유라곤 찾아볼 수 없는 현대인들의 바쁜 모습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야생화들의 인내 를 비교해 보았다. 우리는 어쩌면 작고 작은 풀 한포기에서 조차도 배워야할 게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알고 있던 서양화들의 복잡한 이름들은 야생화 앞에서 아무런 쓸모 없는 이름들이 되어버렸다. 야생화는 내가 전혀 모르던 빛과 향기를 안겨 주었고 자신만이 톡톡 튀는 개성을 지니고 있었다. 꽃이라면 다들 아름답고 예뻐야 한다는 나의 사고방식을 깨고 긴 촉수가 돋아난 엉겅퀴나 어울리지 않을 법한 색들이 뒤엉켜 자라난 것 같은 칡, 벌레들이 우글우글 모인 듯한 촛대승마까지. 넓은 산 속에는 나의 예상을 뒤엎는 특이한 풀들이 가득했다. 야생화들은 색과 모양이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저마다의 특색과 능력을 고루 갖춘 생명체였으며 화려함만이 강조된 서양화들과는 다르게 내가 상상치 못한 다채로움과 다양함이 있는 세계였다. 모두들 ‘꽃’이 되려하는 사회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다. 다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되려고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단조롭고 한가지 길에서만 잔뜩 피어있는 답답한 ‘꽃’들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가 피고 싶은 곳에서 지천으로 널려있는 다양한 색채의 야생화 같은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연 속에서 피어나는 작고 볼품 없는 꽃들에게서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대자연이 가진 진한 감동이었고 교과서에서는 결코 배우지 못할 간단하고도 참된 진리였다. 너무나 복잡하고 피곤한 일상들을 살아가는 우리. 가끔은 짙은 색채를 가진 인상파 화가의 그림같이 너무나 화려한 ‘꽃’들을 피해 작지만 큰 가르침을 주는 우리의 꽃, 야생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 어떨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