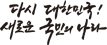지난 6월 3일 일요일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우리 벌밭에 갔다. 벌밭은 우리 고향인 남원의 시골에 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뒷산에는 깊은 계곡이 있는데 항상 맑은 물이 흘렀고 경치가 아름답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온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우리 한봉 농장이 있다. 한봉 농장을 우리는 벌밭이라고 한다. 막내 삼촌이 그곳에다 움막을 짓고 한봉을 치신다. 그래서 삼촌이 보고 싶으면 가끔 벌밭에 간다. 삼촌과 함께 점심을 먹고 나서 어머니는 더덕을 캐러 가셨다. 나는 삼촌의 심부름도 해 드리고 시원한 그늘 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 푸른 숲은 참 좋다. 숲 속은 공기도 맑고 꽃도 피어서 경치도 아름답다. 벌들이 우리에게 꿀도 따다 준다.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 주고 일년 내내 맑은 물도 흐르게 한다. 아름다운 푸른 산이 없다면 삼촌은 한봉 농장 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더 어렵게 살 것이다. 숲속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가 모두 고맙다. 그런데 우리 벌밭 아래쪽에서 놀러온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떠들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그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조용해졌다. 어쩐지 걱정이 되어 자세히 살펴보니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겁이 나서 벌통을 보살피고 계시는 삼촌께 “ 삼촌, 저기서 연기가 나요 ! ”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 뭐, 큰일 났구나.” 삼촌과 나는 연기 나는 쪽으로 달려 갔다. 불이 마른 풀섶으로 옮겨 붙어 타고 있었다. 삼촌과 나는 솔가지를 꺾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불을 껐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우리는 옷을 입은 채로 물 속에 들어가서 더위를 식혔다. 한참 있다가 물에 서 나와 자세히 살펴보니 음식을 익혀 먹었던 자리에 아직도 덜 꺼진 불씨가 남아 있었다. 음식 찌꺼기도 여기저기에 마구 버려져 있었다. 노래하며 내려오는 계곡물 소리가 우는 소리도 같고 어쩌면 아우성 소리도 같았다. 왜냐하면 계곡에 사람들이 빈병을 마구 버렸고 물속에 음식찌꺼기도 가라앉아 있었다. 정말로 기분이 나빴다. ‘계곡물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이사를 가겠다고 아우성인가 보다. 물고기들 역시 못살겠다고 이사를 가겠지. 모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이야. 사람의 몸이 더러워지고 상처나면 아프듯이 산도 저렇게 쓰레기가 많으면 사람의 몸에 때가 끼인 것처럼 더럽고, 산불이 나면 상처 를 입는다.’고 생각한 나는 빈병과 과자봉지를 주워담았다. 그때 더덕을 캐던 어머니도 오셨다. 삼촌은 움막으로 가서 양곡포대와 괭이 그리고 양동이를 가져 오셨다. 우리는 셋이서 물을 떠다가 남은 불씨를 모두 끄고 음식찌꺼기는 양곡포대에 주워 모았다. 그리고 나무 밑 에 땅을 파고 묻으며 삼촌께서 “영한아, 음식찌꺼기는 산과 계곡물을 더럽히지만 나무에게는 좋은 거름이 된단다.”하고 말씀하셨다. 나빴던 기분이 쓰레기를 치우고 나니 좋아졌다. 나는 푸른 산을 좋아한다. 우리는 산에서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를 얻어 살아간다. 꽃도 산에 있고 벌도 산에 있다. 맛있는 꿀도 산에서 얻기 때문이다. 맑은 계곡도 좋다.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놀러갈 때 쓰레기 봉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과 계곡을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산을 더럽히고 상처 내는 일을 하지 말고 내 몸처럼 아꼈으면 참 좋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