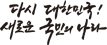[숲이 건강이다] 14 - 국악과 산림치유법
- 작성일2006-11-28
- 작성자 / 최**
- 조회4408
숲에서 음악과 어우러지다, 음악에서 숲과 어우러지다
“현의 정자 둘러싼 것 모두가 대나무인데 마당 앞의 한 소나무 우뚝 솟아 드높구나/(…) 그 어찌 해가리개가 되어 더위만을 막겠는가/또다시 생황되어 맑은 가락 들려주네” 다산 정약용이 차군정(此君亭:경남 함양의 정자)에서 읊은 시이다. 대숲을 스치는 바람소리에서 대나무 대롱을 묶어 만든 악기 생황(笙簧)의 청아한 음색을 떠올리는 한 선비의 상상력에 절로 미소가 떠오른다.
한편 이런 풍경은 어떤가. “홍대용은 가야금을 들고, 홍경성은 거문고를 잡았다. 이한진은 퉁소를 소매에서 꺼내고, 김억은 양금을 당긴다. 장악원(掌樂院) 악공인 보안은 생황을 연주하는데(…) 뜨락은 깊고 대낮은 고요한데, 지는 꽃잎은 섬돌에 가득하다(…) 곡조는 그윽하고 절묘한 경지로 접어든다(…)” 18세기 문인 성대중의 글 ‘유춘오에서의 음악회(記留春塢樂會)’의 일부이다. 실학자인 홍대용의 집에서 선비와 악공이 함께 모여 풍류를 즐기는 모습으로 한양대 정민 교수의 국역을 참고했다. 유교의 예악사상 때문에 음악이 수신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받아들여졌던 정서도 한몫 했겠지만, 선비들이 모여 느직하고 여유로운 영산회상과 같은 풍류악을 즐기거나 시조를 노래하는 일은 이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한마디로 음악은 자연과의 조화였다. 감성적 측면에서 음악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바람을 통해 그 대상이 전달되고, 바람도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음악은 기후로 대표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자연 속에서 음악을 보면서 심신의 화(和)를 유지했던 선현들은 이미 가장 자연스럽게 음악치유와 산림치유를 동일선상에서 경험하고 있었다. 한때 고전학계에서 화제가 된 책으로, 19세기 후반 윤최식이란 퇴계학파의 학자가 쓴 선비들의 일과지침서 ‘일용지결’에는 미시(未時:오후 1~3시)를 자연 안의 여가시간으로 산책과 운동을 권장하며 악기연주까지 당당히 포함시키고 있다.
# 식물성 악기의 식물성 감성, 유순하고 정갈한 숲의 선물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가 쓴 ‘임원경제지’의 이운지(怡雲志)편을 보면 전원 속에 고고한 선비를 위해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마스터플랜’과 ‘인테리어’ 기법이 등장한다. 은자에게 필요한 문화공간인 ‘금실(琴室:거문고방)’ 만드는 방법을 보자. “초당을 지어 땅 밑에 (음악의 울림을 도와 줄) 커다란 항아리를 묻고 구리종을 건다. 그 위에 바위나 목판을 깔아 덮고 위에서 금을 연주하면 소리가 허공에 낭랑하고 맑고 서늘한 느낌을 자아내니 세상 밖에 사는 기분이 절로 든다.” 자연이 선물한 재료로 음악방을 만들어서 청량한 숲의 기운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한 지혜와 멋이 새삼 부럽게 느껴진다. 그렇게 숲의 정서와 산물은 우리 음악에 요람 역할을 해주었던 듯하다.
악기를 보자. 식물성 재질이 눈에 띄게 많다. 대나무로 만든 대금, 피리, 생황 등의 관악기, 오동나무로 된 가야금, 거문고의 공명통, 뽕잎 먹고 자란 누에가 만든 명주실로 만든 악기의 현(絃)들. 그래서 그 울림은 유연하면서도 강인하고 깊이가 있다. 호흡과 손맛에 따라 정감있는 시김새가 가능하며, 기후에 따라 관에 머문 습기나 줄의 긴장감이 달라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숲의 풍경처럼 미묘한 음맛을 느끼게 해준다.
식물성 악기와 음악. 이물감 없이 심신에 도움을 주는 순한 물맛과 같은 음악이다. 전통악곡의 명칭도 숲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 있다. 가령 영산회상 모음곡을 낮게 연주하는 ‘평조회상’은 ‘유초신지곡(柳初新之曲)’이라는 아명(雅名)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봄날 버들의 새잎처럼 온화하고 화사한 느낌을 주고, 아련하면서도 생명력 가득한 봄날의 풍경을 연상케 한다. 봄날
- 첨부파일
중앙행정기관 바로가기
- 감사원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정보원
-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비서실
- 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보훈부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
- 법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인사혁신처
- 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 국방부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중소벤처기업부
- 통일부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검찰청
- 경찰청
- 관세청
- 국세청
- 기상청
- 농촌진흥청
- 문화재청
- 방위사업청
- 병무청
- 산림청
-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 조달청
- 통계청
- 특허청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