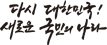[숲이 건강이다] 27 - 아이·나무 함께 크는 ‘도심 허파’
- 작성일2007-03-23
- 작성자 / 권**
- 조회4646
아이들은 소나무 밑에서 솔방울을 잔뜩 주워서 오른쪽 주머니에 가득 채웠다. 그리고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살펴본다. 손잡이가 될 만한 곁가지가 있는 것을 찾아서 장난감 총으로 손에 들고, 또 적당한 길이의 가지는 왼쪽 허리에 칼처럼 차고서 친구들과 뒷동산 숲으로 향했다. 그리곤 해질 무렵 부모님의 부르는 소리에 아이들은 숲에서 나와 집으로 왔다. 찢어진 옷은 “산초나무가시가…”, 손등의 붉은 점은 “옻나무가…”, 팔뚝의 생채기는 “껍질이 거친 상수리나무를 오르다…”, 입가의 검은 얼룩은 “오디(뽕나무 열매)를 따먹다가…”. 아이는 어머니의 핀잔에 숲의 나무 이름을 들먹이며 줄줄이 사유를 둘러댔었다.
어떤 아이들은 토요일이면 어른들의 손을 잡고 물통과 식물도감, 그리고 뭔가 잔뜩 써서 채워야 할 공책을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체험을 위해 수목원과 공원과 숲을 찾아 나선다. 입구에서 설명하는 ‘숲에서 해야 할 일’을 한쪽 귀로 흘리며 숲으로 들어가지만, 정작 관찰 울타리 너머 저만치 있는 하늘만큼 키가 큰 나무를 향해 목을 뒤로 젖혀 올려다보기만 할 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면 친구와 같이 공책만 채우려 애쓴다. 열심히 나무 이름을 외고 있던 아이는 큰 발견의 질문을 던진다. “아저씨 나무는 원래부터 저렇게 컸어요?” “잎은 원래부터 높은 곳에만 있어요?”얘들아 미안하구나! 할말이 없다.
놀면서 저절로 배우는 나무와 숲을 도시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줘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다. 도시의 아이들 가까이 많은 나무와 숲이 필요하듯이 ‘좋은 숲’, 아이들이 저절로 배울 수 있는 ‘친구 같은 숲’이 무엇인지 이제는 생각해볼 때이다.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도시숲’이라는 말은 참 엉뚱한 말이다. ‘도시’는 ‘편리’하게 살기 위한 곳이기에 아파트 수도꼭지에서는 항상 뜨거운 물이 나오고, 밭둑 한번 밟지 않아도 깨끗한 먹을거리가 우리를 기다리는 ‘풍요’함을 준다. 게다가 베란다의 화분 옆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부족하나마 반쪽짜리 ‘인간다운 삶’도 제공한다. 그러나 ‘숲’은 편리한 곳이 아니다. 신발은 더럽혀지고, 방심하면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징그러운 벌레도 있다. 게다가 진짜 숲을 보려면 한참을 나가야 한다. 하나는 ‘인공’이라 하고 또 하나는 ‘자연’이라 불리며 부딪히면 으르렁거리는 두 말이 웃기게도 하나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엉뚱한 두개를 모두 가지려고 하는 것이 도시숲이다.
그런데 편리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인간다운 삶은 사실 함께 하기가 참 힘들다. 1년 농사의 힘든 노력으로 마당에 쌓아놓은 곡식을 보면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지만 편리한 삶은 아니었다. 그 풍요로운 곡식을 이웃과 나누지 못하는 삶이라면 인간다운 삶은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도시숲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도시에 숲이 있으면 편리할까? 풍요로울까? 아니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풍요롭고 편리하며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도시숲은 단연코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만들고 있다. 숲은 걷고 숨쉬게 해주며, 도토리를 입에 문 다람쥐가 내 앞길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에서 ‘온전한 인간다운 삶’을 알게 해주는 곳이지만, 울창하고 풍요로운 숲을 내 집 가까이 가지려면 많은 세월과 힘든 일이 필요하다. 전혀 ‘편리’하지 않다. 그런데 실상은 무척 편리하다. 어느 날 갑자기, 지루한 기다림과 힘든 노력도 없이 누군가 나 대신 하늘만큼 큰 나무로 가득 찬 숲을 만들어 주고, 만든 후에는 ‘자연’인 나무와 숲을 도시민이 좋아할 것이라는 억측으로 깨끗이 쓸고 담아 ‘인공’을 만든다. 어떤 이는 ‘잘 관리된 숲’이라
어떤 아이들은 토요일이면 어른들의 손을 잡고 물통과 식물도감, 그리고 뭔가 잔뜩 써서 채워야 할 공책을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체험을 위해 수목원과 공원과 숲을 찾아 나선다. 입구에서 설명하는 ‘숲에서 해야 할 일’을 한쪽 귀로 흘리며 숲으로 들어가지만, 정작 관찰 울타리 너머 저만치 있는 하늘만큼 키가 큰 나무를 향해 목을 뒤로 젖혀 올려다보기만 할 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면 친구와 같이 공책만 채우려 애쓴다. 열심히 나무 이름을 외고 있던 아이는 큰 발견의 질문을 던진다. “아저씨 나무는 원래부터 저렇게 컸어요?” “잎은 원래부터 높은 곳에만 있어요?”얘들아 미안하구나! 할말이 없다.
놀면서 저절로 배우는 나무와 숲을 도시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줘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다. 도시의 아이들 가까이 많은 나무와 숲이 필요하듯이 ‘좋은 숲’, 아이들이 저절로 배울 수 있는 ‘친구 같은 숲’이 무엇인지 이제는 생각해볼 때이다.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도시숲’이라는 말은 참 엉뚱한 말이다. ‘도시’는 ‘편리’하게 살기 위한 곳이기에 아파트 수도꼭지에서는 항상 뜨거운 물이 나오고, 밭둑 한번 밟지 않아도 깨끗한 먹을거리가 우리를 기다리는 ‘풍요’함을 준다. 게다가 베란다의 화분 옆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부족하나마 반쪽짜리 ‘인간다운 삶’도 제공한다. 그러나 ‘숲’은 편리한 곳이 아니다. 신발은 더럽혀지고, 방심하면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징그러운 벌레도 있다. 게다가 진짜 숲을 보려면 한참을 나가야 한다. 하나는 ‘인공’이라 하고 또 하나는 ‘자연’이라 불리며 부딪히면 으르렁거리는 두 말이 웃기게도 하나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엉뚱한 두개를 모두 가지려고 하는 것이 도시숲이다.
그런데 편리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인간다운 삶은 사실 함께 하기가 참 힘들다. 1년 농사의 힘든 노력으로 마당에 쌓아놓은 곡식을 보면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지만 편리한 삶은 아니었다. 그 풍요로운 곡식을 이웃과 나누지 못하는 삶이라면 인간다운 삶은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도시숲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도시에 숲이 있으면 편리할까? 풍요로울까? 아니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풍요롭고 편리하며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도시숲은 단연코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만들고 있다. 숲은 걷고 숨쉬게 해주며, 도토리를 입에 문 다람쥐가 내 앞길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에서 ‘온전한 인간다운 삶’을 알게 해주는 곳이지만, 울창하고 풍요로운 숲을 내 집 가까이 가지려면 많은 세월과 힘든 일이 필요하다. 전혀 ‘편리’하지 않다. 그런데 실상은 무척 편리하다. 어느 날 갑자기, 지루한 기다림과 힘든 노력도 없이 누군가 나 대신 하늘만큼 큰 나무로 가득 찬 숲을 만들어 주고, 만든 후에는 ‘자연’인 나무와 숲을 도시민이 좋아할 것이라는 억측으로 깨끗이 쓸고 담아 ‘인공’을 만든다. 어떤 이는 ‘잘 관리된 숲’이라
- 첨부파일
중앙행정기관 바로가기
- 감사원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정보원
-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비서실
- 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보훈부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
- 법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인사혁신처
- 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 국방부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중소벤처기업부
- 통일부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검찰청
- 경찰청
- 관세청
- 국세청
- 기상청
- 농촌진흥청
- 문화재청
- 방위사업청
- 병무청
- 산림청
-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 조달청
- 통계청
- 특허청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