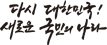다시 북한산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다. 세 번째이다. 50대에 두 번, 그리고 이번에 60이 넘어 세 번째. 두 번 모두 도전이란 말을 선언하고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감히 안 붙였다.
그저 간절하게 위로받고 싶어서 아니 치유 받고 싶어 숲을 찾았기 때문이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3년을 힘들게 지내다가 숲만이 이 숲길만이 나를 치유해주리란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난 주 12구간 충의길부터 11구간, 10구간을 혼자 다녀왔다. 지금 내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둘레길이라 부담없이 다녀왔다. 숲속은 온통 초록이었다. 초록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뿜어나오는 초록 기운으로 둘레 길은 온통 싱그러웠다.
그래도 곳곳에서 많이 울었다. 맘껏 울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다. 가끔씩 숲속 바람이 스치며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조심 나를 안아주었다. 고마웠다. 산들거리는 나뭇잎들도 나의 아픔을 하나씩 나눠가지려고 손을 내미는 것 같았다.
20대에는 처음 숲을 알았다. 아니 산이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한국의 명산 리스트를 작성해 경쟁하듯이 산을 올랐다. 그때 닥치는 대로 올랐던 산. '정상 갔다 왔어'를 자랑하고 싶어 그저 땅만 보고 올라갔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
그때 지리산을 알았고 설악산을 알았다. 도봉산 북한산 관악산 등 서울근교의 산들도 그때 처음으로 산으로 다가왔다. 그전까지는 버스 타고 지나가면 차창으로 보이는 흔한 자연이려니 했다. 학창시절 한양의 풍수지리에 대해 배웠을 때도 꾸며낸 설화려니 했는데 실제로 산에 올라 우리나라 서울이 얼마나 멋진 수도인가를 알고 전율했다. 교과서 속의 한양이 역사를 품고 툭 튀어나오는것 같았다.
무지한 산행이었지만 젊었을 때의 경험은 산을 이해하고 산을 애정하게 했다. 산을 몰랐다면 아마 나는 무식하고 재미없는 20대를 보냈을 것이다.
30대 산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땅만 보고 걷지 않았다. 서로 마음을 나누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산길을 천천히 걸었다. 많은 것이 보였다. 숲이 주는 계절의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었다. 나무한테 인사하면서도 행복했고 나무잎 사이로 보이는 조각난 하늘이 주는 작은 아름다움에도 감동했다.
얼마나 높은 산을 갔다왔나 경쟁하지 않았고 아파트 뒷산이 나의 본향 같았다. 수시로 마실가듯 산에 놀러갔다. 따뜻했다. 산은 넓고 높은 우리 집 정원이었다. 편안했고 든든한 울타리였다.
40대가 되면서 나를 찾고 싶었다. 삶이 어수선했다. 욕심이 욕심을 불러 뒤엉켰던 것 같다. 그때도 나에게 삶의 방향과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한 것이 산이었다. 좋은 벗을 만나 지리산 종주를 했다. 그것도 겨울에....같이 간 벗이 전문 산악인이라 겁도없이 따라나섰지만 눈이 허리까지 쌓인 겨울 지리산을 걸으며 참 많은 생각을 했다.
4박5일의 긴 여정을 끝내고 모두들 털썩 주저앉았다. 지리산을 한번 더 마음에 안고 싶어 뒤돌아 보았다. 아, 진지하면서도 무심하게 서있는 지리산.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지리산에게 큰 절을 했다. 같이 있던 벗들이 어리둥절하면서 깔깔대고 웃었다.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지리산에 감사했고 지리산이 앞으로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토닥토닥 해줄 것 같았다.
40대 이후를 잘 살아갈 자신감도 생겼다. 설령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지리산 종주에서 하루하루 보고 느꼈던 산의몸짓들이 큰 힘이 되리라 확신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헤치며 드디어 천왕봉에 올랐을 때 더 이상 무슨 표현이 있으랴?
온 몸이 감격하고 있는데, 천왕봉 표지석을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는 사진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을 울컥하게 한다.
그러나 삶은 내가 예상하는 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50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갱년기였을까? 아이들 사춘기처럼 내 나이 때 의례적으로 겪는 통과의례려니 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혹독했다. 병원을 찾아 약으라도 해결하려고 했고 누가 어떻게 극복했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해 보았지만 아무 것도 나늘 일으켜 주지 못했다.
혼자 북한산 둘레길을 돌았다.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썼던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여가며 21코스를 돌았다. 가다가 한참 앉아있기도 하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면서 산을 친구삼아 걸었다. 산과 많은 대화를 햇다. 산은 내가 뭐라고 하든 내 말을 잘 들어주었다.
냉장고에 붙여 놓은 북한산 둘레길 지도에 스티커가 다 붙여질 즈음. 산이 숲으로 다가왔다. 산은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주었다.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마다 산은 숲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산은 나에게 결코 정복하거나 올라간 게 아니라고 말했다.
산이 주는 큰 가슴속을 걸어간 거라고 했다. 그제서야 나는 산이 나를 안아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숲은 나를 추스려 주었다. 내가 내민 손을 잡아 주었다. 그래서 50대 후반 또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을 때 나는 고민없이 북한산 둘레길을 씩씩하게 걸을 수 있었다.
숲이 없었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저 숲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 숲은 나에게 위로자이고 치유자였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서울 끝자락 산 밑에 있다. 모두들 왜 여기에 사냐고 하지만 나는 이곳이 참 좋다. 집값이 뭐가 중요하랴? 이유는 딱 한 가지. 산이 가까이 있으면 그것이 최고 아닌가? 일요일 오후 쯤 마음이 꿀꿀해지면 숲길 걸을까 하고 금방 튀어 나올 수 있는 우리 집.
이 큰 산을 누가 퍼 갈리 없으니 우리 집 뒤로 새 아파트촌이 들어설 리도 없고.
숲은 나의 삶의 위기마다 마음을 포개 주었다. 숲을 걸으며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숲을 걸으며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숲을 걸으며 위로를 받았다. 그랬기에 60이 넘은 이제는 산에, 숲에 오른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산이라는 단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게 나를 살려준 산에 대한 내가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예우이다.
나에게 산은 이제 '숲'이고 오르는 게 아니고 '걷는 것'이다. 아니 숲이 내 집인 양 우리 집 넓은 정원인 양 나는 오늘도 숲에 '들어간다.' 숲은 나의 앞으로의 삶에서도 분명 영원한 위로자이고 벗이 되어 줄 것이기에 기대고 싶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숲을 걷는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