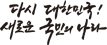초겨울 새벽 5시, 하현달은 서쪽 능선으로 기울어 있다. 스산한 바람에 흔들리는 달은 그 얼굴이 창백하다. 맑고 찬 하늘에 서리는 뿌연 입김을 보며 마스크와 장갑 그리고 모자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산길로 접어들자 맨 처음 밤새 추위에 떤 낙엽의 웅크린 몸이 찢어지는 소리를 듣는다. 이미 떠난 자들의 잔해가 분명한데 왠지 스스로의 과거를 밟고 선 것만 같아 잠시 발가락이 움츠려진다.
태어나 자란 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이었다. 그만그만한 야산이었으나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개울이 있었고, 키 큰 상수리나무와 아카시아가 산자락을 따라 키 재기를 하듯 둘러 서 있었다.
능선 양쪽으로 소나무가 진을 치고 있었으며 군데군데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새떼와 다람쥐, 장기와 까투리가 있었고 진달래와 철쭉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달빛이 산자락과 나뭇가지 사이로 어슴푸레 젖어들면 이미 낙엽을 떠나 달빛을 밟고 선 자신을 본다. 이때를 시작으로 봄이 올 무렵까지 짙은 고독 속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도 이때가 좋은 것이다.
어슴푸레한 달빛일망정 어둠으로부터 어느 정도 간격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그건 생각의 폭을 그만큼 더 넓게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렸을 적 산은 그냥 산이었다. 땅거미가 질 무렵 아버지가 지게 가득 청솔가지를 가져오던 곳이었고 산기슭에서 소에게 풀을 뜯기던 곳이었다. 아지랑이를 따라 어머니가 산나물을 뜨던 곳이었고 거기에 누워 붉게 물든 뭉게구름을 바라보며 꿈을 꾸던 곳이었다.
또한 고만고만한 계집애와 머슴애들이 모여 웃음소리를 드높이던 곳이기도 했다.
산등성이로 올라가는 이따금 잠을 깬 새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듣는다. 새의 울음소리는 온산을 휘감아 울려 퍼지고 산중턱 지나 모퉁이에서 사람 형상을 닮은 고목의 잔해와 마주친다. 처음 얼마간 새의 괴성에 놀라 머리끝이 쭈뼛해지고 사람 형상을 닮은 고목을 애써 외면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그뿐, 감흥이 없다. 감정이 무디어지거나 모질어진 탓이리라.
나이가 들어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어렸을 적에는 몰랏던 '등산'이라는 걸 알고 나서 부터였다. 몇 발짝 올라가지 못해 얼굴이 핼쑥해지고 속이 울렁거렸다.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쫓아가다 쓰러져 노란 하늘을 쳐다보며 한참을 누워 있어야만 했다. 과도한 술과 몇번씩이나 끊었다 피우기르 반복하는 담배도 한몫 거들었을 것이다. 점차 술을 줄이고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잦아졌다.
산을 오르기란 매번 쉽지 않다. 똑같은 길 똑같은 풍경인데 언제나 거친 숨결을 토해내게 된다. 한 발 한 발, 달빛을 밟은 채 산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숨소리가 가슴을 지나 아랫배에 다다라 있다. 이마와어깻죽지에 내비친 땀을 시작으로 온몸은 이미 뜨거워져 있다. 올라갈 때 늙은 황소의 무겁던 발걸음이 내려올 땐 나비의 날갯짓처럼 날벼하고 경쾌하다. 참으로 떨쳐버리기 어려운 새벽 이불 속 감미로운 유혹을 벗어나 달빛을 밟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능선을 따라 걷게 되었다. 늦가을 해거름 무렵 산행은 말 그래도 풍경 자체였다. 골짜기에서 소슬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나무에 걸린 가랑잎이 마치 새떼처럼 무리를 지어 내려앉곤 했다.
그 정경의 경이로움이라니. 꼬불꼬불 오르막 내리막이 이어지는 산길에서 가끔 다람쥐와 산고양이를 만났다. 겁먹은 다람쥐의 눈망울에 언뜻 가슴이 저려오고 호랑이를 흉내 낸 살찐 고양이의 묵직한 발걸음에 실소를 머금었다. 그러나 다람쥐도 고양이도 그대로 풍경이 되었다.
달빛이 없을대는 스스로 발자국 소리와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 숨소리를 헤아리며 가슴속으로 독백을 한다. 그러나 달빛과 함께 할 때는 그의 어슴푸레한 시선을 따라 그에 걸맞은 대화가 있다. 조금 흐트러진 모습도 드러나지 않으며 단정하지 않은 옷매무새도 흉이 되지 않는다. 작은 소리로 이야기할 때나 절규에 가가운 고함에도 그는 무감각하다.
다만 다소곳한 시선을 발등에 얹은채 그저 가만히 듣고 있을 뿐이다.
거친 숨소리가 정겹게 들리기 시작했다. 숨소리는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으로 약한 몸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비틀거리며 멈추어 서고 싶은 춤과 노래를 그래도 괜찮다며 다독거려 주었다. 산등성이에 올라선 자의 휘파람 소리보다 7부 능선에서 헐떡이는 자의 거친 숨소리가 더 가슴에 와 닿게 되었고, 3부 능선에 주저앉은자에게도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게 되었다.
한 걸음 걸으며 어제와 그제의 일을 생각하고 한 발 떼어 놓으며 오늘과 내일의 모습을 말한다. 한곳에 머물다 스러져 버리고 마는 소용돌이는 결코 되지 않으리라. 지금 더운 숨소리에는 생활에 대한 분노와 집착, 삶에 대한 오기와 패기가 진하게 배어 있다. 거친 숨소리는 어슬푸레한 달빛 속에 녹아내리며 발끝과 얼어붙은 낙엽 위로 조금식 젖어든다. 이 모습을 애서 감추고 싶지 않은 것이 또한 현재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다.
나무만 보면 숲을 볼 수 없고 숲만 보면 나무를 볼 수 없다고 한다. 산을 올라가 보아야 그 실체를 알 수 있고 골은 들어가 보아야 그 깊이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람 사는 세상일이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말 주요한 것은 젖은 새벽의 달빛 속, 그 산길을 묵묵히 혼자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스치는 바람을 따라 거친 숨결을 따라 주위의 일들이 사람들이, 위로 아래로 스치며 지나간다.
살아 잇는 동안 달빛 밟기는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그냥 달빛 자체가 되고 싶다. 나뭇가지에도 걸리지 않고 물에도 잠기지 않는 그런 달빛이 되고 싶은 것이다. 칙칙한 나무와 나무 사이로 엷은 햇살이 얼굴을 내밀 때쯤 달빛 밟기는 끝이 난다. 그 비스듬한 노란 햇살에는 달빛을 넘어선 상쾌함과 눈부신 황홀이 점점(點點) 번져 나온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