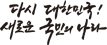"오래 오래 건강하시고, 영양제도 쭉쭉 자십시오."
흰 머리 성성한 노인께 드리는 문안 인사가 아니다. 칠십 넘은 노인이 사백삼심 살 먹은 나무에게 올리는 극진한 마음이다.
고목(古木)앞에 겸손히 손을 오므린 노(老)의사의 옷자락이 마냥 희었다. 그토록 정갈한 의사 가운을 본 적이 있었던가. 아침 신문이 성실한 독자에게 안겨주는 선물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국내 1호 '나무의사' 강oo 원장의 기사를 읽은 것은 지난 식목일 즈음이다.
숲이 좋아 숲을 벗해온 그의 병원은 이름도 꼭 어는 이야기책 속에 나올 법한 '나무종합병원' 갓난아이가 수염 거뭇한 청년이 되고도 남았을 삼십 년 동안 그는 줄곧 숲을 따라 나무를 치료왔다. 사진 속 숭굴숭굴한 얼굴엔 그의 한결 같은 시미성이 곱게 물들어 있었다.
나무병원의 의사는 환자를 찾아 숲으로 직접 왕진을 가야 한다.
강 원장은 "고봉(孤峰)에 자리 잡은 환자도 많이 계시니, 나무의사는 반(半)산악인이 돼야 한다"고 했다.
숲길의 일부가 된 그의 걸음이 마치 도인(道人)의 자취를 따라 산을 오르는 수도자의 뒷모습을 닮았다.
진찰은 먼저 작은 망치를 들고 나무 둥치를 '통통' 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수박도 잘 익었는지 알려면 손가락으로 통통 두들겨 소리를 들어봐야 하듯이, 나무도 속이 얼마나 건강한지 망치로 두들겨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누구든 하늘로 쭉 뻗은 나무줄기와 잎사귀에 눈이 가기 마련이건만 삼십 년 넘게 나무를 봐온 의사는 '겉'을 보지 말고 '속'부터 보라 한다.
진찰이 끝나는가 싶으면 처방이 내려진다.
마치 사람이 맞는 링거 주사와 꼭 같이 생겼다. 5% 포도당과 질소 · 인산 등이 섞인 푸른빛의 영양제를 나무 위에 걸어두고, 그 아래 주사를 놓듯 공구로 살짝 구멍을 낸다.
영양제를 슬몃슬몃 들이키는 나무 앞에서 강 원장은 "내 나이 일흘이 넘었지만 이 나무 할아버지에 비해서는 아직 젊디젊다."고 말한다.
삼십 년 넘게 몸에 밴 것은 '섬김'이던가. 깍듯한 존댓말 속에 조물주의 예술품을 대하는 경외심이 스며 있다.
종종 링거액 치료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다. 폭설로 쌓인 눈 때문에 아름드리 소나무 몸통이 와작 부러지기도 하고, 태풍이 심술이라도 치면 갈참나무가 뿌리째 숭덩 뽑히는 일도 잇다. 한치 앞을 못 보고 고된 인생 풍파에 시달리는 인간의 삶과 어찌 그리도 닮았는지. 강원장은 그것을 '훼손된 나무'라 하지 않고 '아픈 나무'라고 한다. 나무의 고통을 함께 느끼려는 것이다.
살릴 수 잇다고 생각되는 나뭇가지는 쪼개진 가지 중간에 철심을 박아 붙이고, 껍질이 벗겨진 곳에는 코르크 재질로 된 인공 수피(樹皮) 이식 수술을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다. 그것이 살아 있는 자의 도리다. 죽은 나무 앞에서는 경건한 자세로 그의 넋을 빈다. 한 많은 생의 최후는 호젓하고, 이를 바라보는 산 자의 연민은 엄숙하다.
그러나 부러진 가지가 썩어 흙이 되고 그 안에서 다시 꼼틀꼼틀 새순을 길어 올리는 기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심원(深遠)섭리의 일부가 되기 위해 그는 삼십 년 동안 스스로 나무되기를 자처하여 숲 속에 우두커니 섰다. 그것은 그의 육신이 흙바람에 ㄴ라리는 순간까지 이어질 것이다. 보얀 이끼처럼 흙빛 서린 그의 의사가 이와 같은데, 하물며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는 더더욱 믿음직스러워야 하지 않을가.
허나 실상은 갈수록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의술의 문제가 아니다. 섬김의 문제이다. 어딜 가나 '의사'라면 넙죽대고 떠받드는 세상이 되다 보니 힘겹게 의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장원급제라도 한 마냥 그들의 뒷목이 뻣뻣해진다. 의사 가운을 양반 두루마기처럼 으리으리하게 둘러댄 의사 앞에선 환자가 도리어 주눅이 든다.
비단 의사들분이겠는가. 온 세상이 힘과 지위를 쫓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 와중에 흠 있고 모난사람은 더 이상 공감과 치유의 대상이 아니다. 번지르르한 조건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주된 잣대가 되고 내면의 물결소리는 세속(世俗)의 급류에 휩쓸려 자취를 감추었다.
온 세상이 다 똑같이 키 크고 억센 나무만 있다면 숲이 지금처럼 아름다울까? 그런데도 이 사회는 숲을 생전 보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에 의해 굴러간다. 정치며 경제며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람섬김'이 가뭄에 콩 나듯 하다.
강 원장은 "나무와 인간은 공존하기에 나무가 죽으면 결국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무를 향한 섬김 없이는 사람을 향한 섬김도 없는데, 그런 세상에서 나무나 인간이 어디 번듯하게 자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마음이 덜커덩해지는 일침이다. 누구처럼 나무의 속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할지언정, 하다못해 겉으로 내뻗은 나무줄기와 이파리에마저 무심해지고 마는 오늘날, 우리 곁에 나무 닮은 인간이 진정으로 그립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