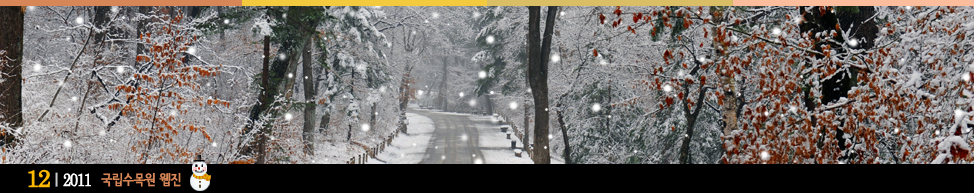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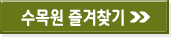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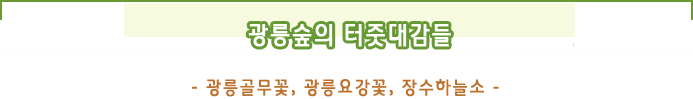

40여 년 동안 보존되어 온 천연림, 광릉숲. 저멀리 보이는 광릉숲에는 수피가 울퉁불퉁한 큰 키의 서어나무, 100년은 훌쩍 넘겼을 졸참나무, 숲 군데군데 층을 이룬 잎의 층층나무가 빽빽하다. 그 아래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어린 나무들이 도토리 키 재기를 하고, 나무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는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새들의 지저귐에 간간히 섞여 나오는 벌레들의 울음마저 반갑다. 천혜의 자연이며 다양한 생물자원의 보고인 광릉숲은 태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왔다. 시간이 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천하는 천이의 과정을 제외하고 광릉숲은 언제나 그대로였다. 생태계의 속성이 변화하면서 많은 생물들은 없어지거나 혹은 생겨나곤 했으며, 아직까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머지않아 멸종될 위기에 처해있는 종들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광릉숲의 터줏대감, '광릉'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그들이 있기에 광릉숲은 아직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광릉골무꽃. '광릉골무'라 불리기도 하는 꿀풀과의 다년생초본인 그는 한국, 그 중에서도 경기도 광릉지역의 낮은 지대나 산지 숲속 그늘에만 분포하는 특산종이다. 5~6월에 피는 꽃의 모양이 골무꽃과 닮았으나 연한 하늘색으로 피며 광릉의 숲속에서만 핀다하여 '광릉골무꽃'이라 이름이 붙여졌다. 높이는 50~70cm인데 뿌리줄기가 옆으로 길게 자라고 줄기의 능선에 털이 있으며 잎은 마주 달린다. 타원형 또는 달걀 모양의 타원형으로 잎의 가장자리에 굵은 톱니가 있으며 짧은 잎자루가 있다. 광릉골무꽃은 관상가치가 높고 어린잎이 식용, 풀 전체는 폐렴, 경풍, 해열 등의 약재로 활용할 수 있어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남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량증식에 의한 개체수 확보는 물론 자생지외 보존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 발견된 곳이 광릉이며 뿌리에서 지린내가 난다 하여 지명을 앞에 붙여 광릉요강꽃으로 불리워진 그는 우리나라 산지 햇볕이 드는 곳에 자생하는 다년생 난초다. 현재 광릉이외에 전라북도, 강원도 등에서 새로운 자생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5월 초순에 잎 사이에서 한 개의 꽃대가 올라와 한 송이의 꽃을 피우는 광릉요강꽃. 연분홍색 바탕에 적자색 무늬와 점이 흩어져 있는 광릉요강꽃은 이름과는 달리 그 자태가 참하고 수줍다. 꽃과 더불어 잎의 생김새가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이용되는 그는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광릉숲에서도 그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미 멸종위기야생식물1급인 광릉요강꽃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자생지 훼손을 막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가 연두색 철망을 벗어나 매년 수줍게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

딱정벌레목(Coleoptera) 하늘소과(Cerambycidae)에 딸린 대형 딱정벌레의 하나인 장수하늘소. 산림이 울창한 숲속 활엽수림대에 서식하는 장수하늘소는 과거에 강원도 춘천 및 오대산 지역에서도 채집되었지만 현재는 경기도 광릉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 중국 동북부, 러시아 연해주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분포하며 일본에서도 기록된적이 있으나 정착여부는 불확실하다. 몸길이는 수컷 80~110mm, 암컷 65~90mm 내외이고, 몸은 검정색 또는 흑갈색 바탕에 황갈색 무늬를 띠며 광택이 강하다. 생활사는 1세대에 2~3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상세히 조사된 바가 없다. 암컷 성충은 서어나무,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등의 재질부에 산란하며 애벌레는 갱도를 뚫고 그 속에서 나무를 파먹으며 생활한다. 유라시아 대륙의 하늘소 중에서 제일 큰 종으로서 곤충류 중에서는 최초로 장수하늘소 서식지가 천연기념물 제75호로 강원도 춘천지방에서 지정된 바 있으나 소양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었다고 한다. 그 후 천연 기념물 제218호로 다시 지정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채집된 표본이 불과 20개체 미만으로 매우 희귀한 종이기 때문에 1998년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대상이 되었다. 곤충의 대왕, 장수하늘소. 쉽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를 하루 빨리 만나고 싶다.




